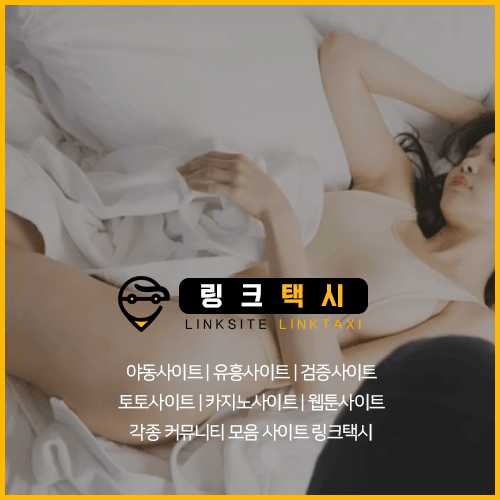작성자 정보
- 토토의민족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13 조회
-
목록
본문
그녀, 경아. --- 4부

술을 제법 마셨나? 아니, 금요일 밤에 이 먼 M시까지 내려와서 제법 마셨냐고 자문자답하고 있는 건 뭘까.
나를 좋아했던 것 맞냐는 그녀의 질문에 마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고 묻는 것마냥 주변을 둘러봤지만 결국 나한테 묻는 거겠지.
“뭐..
그랬던 거 같아.” “그래? 근데 그랬던 것 같은 건 뭐야?” 얘는 뭔 남의 상갓집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싶어서 바라보니, 이미 그녀의 눈은 애매하게 풀려있다.
취해서 가야겠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기도 뭐한 그 애매한 눈빛.
그러고 보니 흐트러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발음에 술기운이 진하게 녹아난다.
나 역시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
그녀의 질문은 회피하고 내 멋대로의 말을 한다.
“경아야, 이제 일어나야 될 거 같은데?” “아직 안 온 사람도 많은데 어딜가 오빠.” “자리 안 채운 사람도 많은데 우리라도 일어나 주자.” “오빠는 너어무 다른 사람 입장을 못 벗어난다니까.” “뭘..
늘 그냥 이렇지.” “화장실 좀 갔다가 나갈게.
어디갈지 생각해봐.” 생각을 하긴 무슨.
난 M시에 와 본 적도 없거니와, 유흥가가 아니고서야 서울 인근이라도 늦은 시간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의 경우의 수도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술도 안주도 그냥 나오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면 그만이고 하니 그냥 멀쩡해 보이는 호프집에 들어간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비를 얼마나 내야 될진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소주는 독하고 맥주는 싱겁다는 그녀의 말에, 주종은 소맥으로 결정.
한 잔, 두 잔 그렇게 마시던 술은 어느덧 가물가물.
장례식장 마지막의 어색함을 지워보고자, P를 추억한답시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뭔가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말을 멈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싶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술을 따르면서 묻는다.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냐?” “응, 가야지.” 시계를 보니 벌써 두 시다.
“지금도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오빠.
오빠 문제가 뭔지 알아? 오빠는 말이 너무 많아.
오빠가 참견 다 안 해도 되거든? 오빠는 하여튼 성가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오빠, 오빠가 박힌다.
“너, 취했어.” “오빠도, 취했거든?” 아니라고는 대답 못하겠다.
“오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 샷?” 벌써 몇 번 째 인지도 모르는 원 샷을 아직도 원 샷을 외쳐야 하나 싶다.
장례식장에서 종이컵 한번 부딪히지 않은 게 서운했던가? 술이 상당히 버거워졌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맞춰준다.
훌쩍 훌쩍 잔을 비우는 속도가 느려진다 싶을 때쯤 아까 떠들던 내게 바통을 넘겨받은 것처럼, 경아는 학교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재잘대기 시작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나 가지고 있을법한 추억들에 대해 말을 맞추고 있었는데, 글쎄.
너무 취했던 건지 말을 맞추다 못해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다.
싸구려 호프집에서, 당시에는 덮지 못했던 그녀의 입을 우악스럽게 덮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되뇌이면서.
입을 맞추고 입술을 비비고 두꺼비마냥 그녀의 입술을 한 움큼 물어대는 와중에 그녀의 입이 조금씩 벌어진다.
“오빠, 나..” 뒷말이 이어지긴 했지만 전해지지 않는다.
듣고 싶지 않다.
더 크게, 그녀의 얼굴을 반쯤은 삼킬 것마냥 베어 물듯 그녀의 입을 덮는다.
처음엔 그녀가 먼저 다가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녀의 반응은 전혀 없다.
다가오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그녀.
반응 없는 입맞춤을 한창을 일방적으로 선사하다, 크게 한 번 숨을 들이키고 입에 맴돌던 말을 그녀에게 흘려보낸다.
“미안하지만, 오늘 같이 있고 싶다.” 이 말이 입을 돌아다닐 때부터 예견했다.
저 한 마디 때문에 오랜 시간 이불을 걷어차리라는 것을.
대체 왜 난 미안하다는 말을 붙여야 했을까.
무엇을 왜 사과하는 것이고, 굳이 사과까지 해야할 말을 왜 입 밖으로 뱉어버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심지어 아직 뱉지도 않은 말을 먼저 사과하고 그 뒤로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에 크게 의미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그 때 저 말에, 그녀가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끄덕였다는 점이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